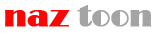체인징
1화
웹소설 작가 -
본문

제1장 그놈의 더러운 손길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가장 사랑하고 보석처럼 아끼는 외아들인 연수가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윤정은 지금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견딜 수가 없었다. 노곤한 몸을 달래주던 단잠은 이미 어디론가 사라진 지 오래였다.
속된 말로 그녀는 지금 뚜껑이 완전히 열려 있었다. 꿀맛처럼 달콤했던 휴식의 여운이 완전히 사라진 피곤한 전신 곳곳에 흉측한 벌레가 기어 다니는 듯한 불쾌감으로 어쩔 줄을 몰랐다.
윤정은 정신이 없는 와중에 몸을 벌떡 일으켜 누군가가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진 열린 문 밖을 노려보았다. 그리고 빠른 손놀림으로 치마를 들쳐 올린 후, 손을 아래로 뻗어 자신의 사타구니 사이를 더듬었다.
“서, 설마…….”
불길한 예감으로 인해 허둥거리던 손바닥이 허벅지 안쪽을 더듬어 올라가면 갈수록 자신에게 불쾌감을 안겨주었던 무언가를 찾기 위한 손길이 무척이나 조심스러웠다.
불쾌감의 잔재가 가장 많이 느껴지는 곳이 바로 그곳이었던 것이다. 조금 전에 무언가 뭉툭하고 뜨겁고 단단한 이물질의 마찰감이 느껴지던 곳. 처음에는 자신의 몸이 하도 피곤해 방금 전에 일어났던 일이 현실인지 아니면 꿈을 꾸고 있는 것인지 잘 분간이 되지 않았다.
강력한 접착제로 붙여놓은 것만 같이 천근만근 무거운 눈꺼풀을 간신히 치켜뜬 눈동자에 처음 들어온 것은 더러움으로 얼룩져 지저분하기 짝이 없는 천장이었다. 그런데 그때 이상야릇한 소리가 들렸다.
“으으으…… .”
자신의 다리 아래에서 간헐적으로 들려오는 짐승이 낮게 헐떡거리는 듯 낯선 누군가의 신음소리와 함께 어우러져 치맛자락이 조심스럽게 뒤척이는 소리에도 그녀는 곧바로 눈을 뜰 수가 없었다.
마치 귓속을 계속 울리는 이명 때문에 어지러움을 느낀 윤정은 눈을 뜨려다가 도로 눈을 감고 말았다. 어제 저녁 무렵부터 오늘 동이 틀 아침까지 일해야만 했던 그녀는 너무 피곤했던 것이다. 아들 연수는 물론이고 자신이 생활을 영위해야만 하는 윤정으로서는 무슨 일이든 해야만 했기 때문에 이웃의 도움으로 일자리를 소개받아 그녀는 24시, 하루 종일 영업하는 식당일을 나갔던 것이다.
그런데 일이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았다. 그렇게 고된 노동은 이제 사십이 갓 넘은 그녀의 인생에서 처음 해보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래서 집에 들어오자마자 그대로 쭉 뻗어버린 윤정은 죽은 듯이 잠속에 빠져들고 말았다.
얼마나 깊은 잠 속에 빠져들었던 것일까. 얼마나 죽음처럼 깊은 잠을 잤는지는 알 수가 없었다.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감지한 윤정은 누군가 자신의 사타구니 안쪽을 더듬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조금씩 의식을 회복했다.
그녀가 젖은 솜처럼 무거운 눈꺼풀을 뜨자마자 윤정이 잠에서 깼다는 것을 그제야 알아차린 누군가가 후다닥 몸을 일으키더니 잽싸게 방을 빠져 나가는 것이었다. 잠에서 덜 깨 꿈을 꾸는 듯 윤정의 흐리멍덩한 눈동자에 들어온 것은 전광석화처럼 도망치는 남자의 뒷모습이었다.
비몽사몽간에도 윤정은 도둑놈처럼 몰래 들어와 자신의 몸을 더듬고 도망친 사람이 누구인지 알 것 같았다. 저런 거구의 몸을 가진 남자는 이 동네에서 몇 안 되는 흔치않은 인물이었다. 비겁하게 자신이 잠든 틈을 이용해 유린하다시피 몸을 더듬다 도망간 남자는 바로 아들 연수의 친구인 정우가 틀림없었다.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 오늘로서 벌써 두 번째였다. 처음에도 이번 상황과 거의 흡사했다. 그날도 오늘처럼 깊이 잠들어 있는 윤정의 몸을 치한처럼 몰래 더듬다가 그녀에게 발각된 정우가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며 용서를 구하는 바람에 그냥 넘어갔었다.
그래서 몹쓸 짓을 한 당사자인 정우보다는 아들 연수에게 꾸지람을 주며 문단속을 단단히 상기시키는 동시에 친구에게 집 키를 함부로 주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었다. 그런데도 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었다.
도저히 오늘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다. 더럽고 비참한 기분을 느끼며 윤정은 자신의 허벅지 안쪽을 조심스럽게 더듬다가 그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무언가 이상했다.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곳에서 색다른 느낌이 감지된 탓이었다. 손가락 끝에 닿은 끈적거림에 윤정은 화들짝 놀랐다. 혹시나 그 이물질이 남자의 정액이 아닐까 하는 불길한 기분에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손가락으로 훑어보았다. 하지만 정액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기에 윤정은 잠시 가라앉았던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남자가 흥분하면 조금씩 몸 밖으로 새어나오는 어떤 물기 같은 거라는 것을 알고 있는 윤정은 분노 때문에 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었다. 하마터면 큰 일 날 뻔했던 아찔한 상황이었던 거였다.
만약 자신이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더라면…… 생각만 해도 몸서리가 쳐졌다. 이로서 방금 전에 이 방에서 일어났던 일이 꿈이 아닌 현실이었다는 사실에 그녀는 망연자실한 기분이 되어 긴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발목까지 덮여 내려오는 긴 치마를 둘둘 말고 선 상태에서 윤정은 주춤거리며 화장대 앞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전신거울 앞에 정면으로 섰다. 고개를 숙여 자신의 아랫도리를 확인하기 어려운 탓에 거울 앞에 선 것이었다. 팬티가 조금 아래로 내려가 함부로 흐트러져 있는 모습이었다.
“ㄱㄴ의 새끼!”
전신거울로 아랫도리를 슬며시 내려다보고나서 그녀는 걷잡을 수 없는 화로 인해 자신도 모르게 욕설을 내뱉고 말았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 아니할 수 없었다. 윤정은 또 한 번 긴 한숨을 몰아쉬었다.
“휴우~”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그녀는 흐트러진 팬티를 두 손으로 추슬렀다. 그런데 끌어올렸진 팬티가 막상 맨살에 닿자마자 윤정은 놀란 자라목처럼 몸을 움츠리고 말았다. 순식간에 닭살이 돋을 만큼 소름이 끼친 그녀는 끌어올린 팬티를 다시 밑으로 황급히 까 내렸다.
그리고 팬티 한 가운데를 손가락으로 더듬었다. 팬티의 정 중앙이 축축이 젖어있었다. 손가락 끝에 닿은 감촉이 이번에도 남자의 정액은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못내 찜찜한 기분을 감출 수가 없었다.
이물질은 자신의 사타구니의 은밀한 부분에서 흘러나온 것이 틀림없었다. 도대체 자신이 잠들고 있는 사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스물 살도 안 된 건장한 청년이면 당연히 샘물 솟듯 솟아오르는 성욕을 윤정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다.
- 이전글훔친 사과가 맛있다. 20.01.3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