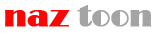목줄
1화
웹소설 작가 -
본문

밖에서 볼 일을 마친 후에 집으로 돌아가 현관문을 막 열고 안으로 들어섰을 때였다.
“어머, 어머! 쟤 좀 봐.”
작고 비좁은 집에서 거창하게 서재라할 것도 없지만 작업용으로 쓰는 내 방에서 낯선 여자의 호들갑스러운 목소리가 밖에까지 들려오고 있었다.
나는 신발을 벗다가 문득 시선을 아래로 떨어뜨렸다. 여러 켤레의 신발들이 어지러이 현관에 놓여 있었는데, 그 중의 한 켤레는 눈에 자주 익은 신발이었다.
“깔깔깔. 진짜 미치겠네. 저 미친 년, 도대체 술을 얼마나 처먹었기에 제 몸뚱이 하나 가누지 못할까? 어라? 얼씨구! ㅈㄹ하고 자빠졌네. 킥킥킥.”
평소 목청이 큰 마누라의 목소리가 밖에까지 크게 들려오자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지금 내 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짐작이 가고도 남았다.
내가 약속 때문에 밖으로 외출한 틈을 이용해 집으로 일찌감치 먼저 퇴근한 여편네가 이 집에 우리랑 똑같이 세를 들어 바로 옆집에서 살고 있는 아름이 엄마를 내 방으로 끌어들인 것이었다.
할 일 없는 여편네들이 대낮부터 방에 모여 혹시나 나중에 참고자료로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주섬주섬 모아놓은 야동들을 보면서 수다들을 떨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나는 까치발을 하며 조심스럽게 방으로 다가섰다. 절로 눈살이 찌푸려질 만큼 언제나 호들갑스러운 마누라에게는 조금도 흥미가 없었지만 저 야하디야한 동영상을 같이 감상하면서 보여줄 아름이 엄마의 반응이 자못 궁금한 거였다.
그러자 아름이 엄마의 윤곽이 바로 눈앞에 서 있는 것처럼 아른거렸다. 한 눈에도 확 시선을 끌어 모을 만큼 아름답고 예쁜 얼굴이 인상적이었지만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내성적인 성격 탓에 매일 얼굴을 부딪치면서도 언제나 조심스러운 여자였다.
진한 쌍꺼풀과 커다란 눈, 그리고 오뚝 솟은 콧날과 자그마하면서도 도톰한 입술이 균형 있게 잘 배치된 얼굴은 늘 어두웠고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런 여자가 마누라와 같이 야동을 보고 있으니 내가 호기심을 가지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었다.
나는 문에 귀를 기울였다. 나도 모르게 몰려오는 이상야릇한 긴장감에 어처구니가 없어 실실 헛웃음이 나왔다.
“어휴! 저걸 어째? 바로 옆에서 자기를 찍고 있는 것도 모르고……이래서 여자들은 술을 처먹어도 늘 긴장을 해야 한다니까.”
나는 귀를 쫑긋거렸다. 지금 방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는 내가 처음 들어보는 목소리였다. 마누라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귀에 익은 아름이 엄마의 목소리도 아니었다. 내가 의아해 하고 있는데 톤이 높은 마누라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깔깔. 완전히 갔네. 갔어. 저년, 대체 얼마나 퍼먹은 거야? 볼 일 다 봤으면 곧바로 나갈 일이지 화장실에서 전화기를 붙잡고 뭐라고 쫑알쫑알 거리는 거야? 혀가 완전히 꼬여서 자세히 들어봐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먹을 수가 없네. 어휴! 저렇게 떡이 됐으니. 자아~이게 끝이야. 우리 다른 거 볼까?”
또 다시 들려오는 마누라의 목소리에 나는 방안에서 그녀들이 어떤 동영상을 보고 있는지 나름대로 짐작할 수가 있었다.
인터넷에서 ‘꽈당녀’인지 ‘꽐랑녀’ 인지 아무튼 술에 잔뜩 꼴은 어떤 젊은 여자가 화장실 변기에 앉아 볼 일을 보다가 술에 취한 제 몸뚱이를 가누지 못해 앞으로 고꾸라지는 그런 내용이었다. 웃기기는 했지만 별 다른 내용은 없었다.
“아름이 엄마. 이거 별로지? 이딴 허접스러운 거 말고 내가 진짜 죽이는 거 보여줄까?”
마치 지나가는 사람에게 호객을 하듯 마누라의 큰 목소리가 갑자기 은밀스러워졌다. 나는 문에 대고 있던 귀를 더 바짝 붙였다. 마누라의 물음에 아름이 엄마, 그녀가 어떤 대답을 할 지 몹시 궁금했기 때문이었다. 말하자면 응답하는 형태에 따라 그녀의 성적취향을 알아차릴 수 있지 않을까 싶었다.
겉으로는 정숙하고 조신해 보이기가 이를 데 없는 아름이 엄마는 과연 야동 감상하기를 좋아할까? 겉보기와는 달리 그녀는 그 짓하는 것을 좋아하는 여자일까? 물론 야동 보는 것을 좋아한다고 섹스까지 밝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럴 확률이 높다는 것이 내 지레짐작이었다.
“그래. 우리 다른 거 보자.”
내가 기대했던 목소리 대신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대답했다.
“이게 말이야. 깔깔깔. 왜 갑자기 그거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 그러면 의자에 앉아있는 우리 남편 허벅지 위에 올라타고 앉아 이걸 같이 보면서 섹스를 한다는 말씀이야. 완전 죽이는 거 있지? 얼마나 짜릿짜릿한지 모른다니까. 경선이, 너도 보면 아마 환장 할 거야. 자아~ 서론은 그만하고 이제 작품을 감상해 보실까?”
“어머, 그 정도니? 빨리 틀어봐. 얘.”
저 여편네가 진짜! 마누라와 친구가 주고받는 대화를 엿듣다가 나는 부아가 치밀었다. 아무리 털털하고 거침없는 성격이라고 할지라도 부부간의 은밀한 사생활을 남에게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적나라하게 까발리는 마누라의 가벼운 입이 못마땅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엎드리면 코가 닿을 만큼 바로 옆집에 사는 아름이 엄마가 있는 곳에서 저렇게 천박하게 노골적으로 지껄이다니!
하기는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가 있는 지 단 번에 파악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이니 그런 말도 서슴없이 할 수 있겠지만 말이다.
그나저나 가만있어봐라. 경선이라고? 경선이? 경선이가 누구더라? 어디서 많이 듣던 이름이었다.
잠시 후, 나는 방안에서 흘러나왔던 낯선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알아차릴 수 있었다.
경선이라는 여자는 마누라의 친구였다. 평소 나서기 좋아하고 오지랖이 넓어 대인관계가 폭넓은 마누라의 친구 중의 한 사람일 터였지만 얼굴은 구체적으로 잘 떠오르지 않았다.
“하! 어머머, 어쩜 저렇게……”
잠시 후, 유난스러운 목소리로 마누라의 친구가 호들갑을 떨어댔다.
“크크크. 어때? 죽이지? 화끈하지?”
맞장구를 치는 마누라의 목소리가 커다랗게 들려왔다.
“나이도 어린 것들이 저렇게 대범할 수 있을까? 진짜 노골적이네. 근데 가만히 보니 누가 뒤에서 저 모습을 찍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응. 저 남자애의 친구인가 봐. 찍어주는 것 정도가 아냐. 저 어린 계집애가 얼마나 색을 밝히는지 좀 있다 두고 보면 알 거야.”
밖에서 숨을 죽이며 엿듣고 있던 나는 그녀들이 방 안에서 어떤 야동을 감상하고 있는 지 이번에도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었다.
몇 번씩이나 봐도 지겹지 않고 볼 때마다 사람 환장하게 하는 동영상이었다. 한마디로 대단한 야동이었다. 실제 아무런 감흥이 없다가도 나는 저 야동만 보면 불같은 욕정이 솟구치고는 했었다. 마치 잃어버린 입맛을 별미음식이 되찾아주듯 말이다.
“얘, 좀 천천히 보자. 뭘 그렇게 급하다고 앞으로 돌리니?”
마누라의 친구인 경선의 볼멘 목소리가 문밖으로 흘러나왔다. 마누라가 동영상을 앞으로 빨리 재생시키는 모양이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