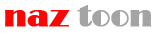처제라는 이름의 욕정
1화
웹소설 작가 -
본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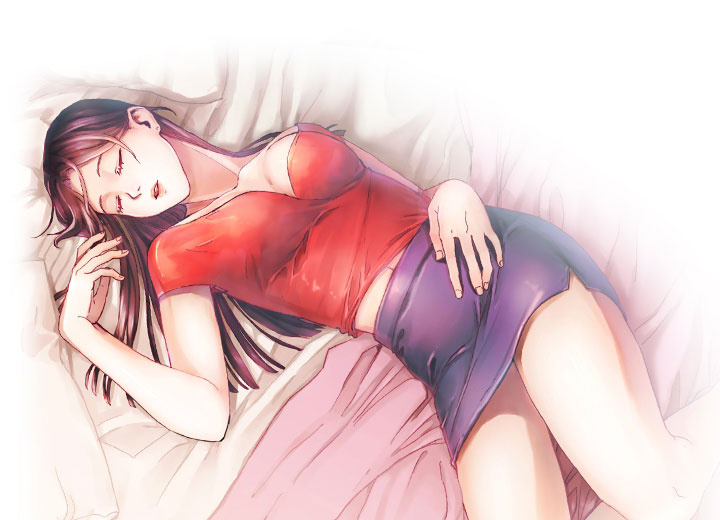
똑같은 사람일지라도 사람에게는 각자가 풍겨내는 독특한 체취가 있다. 나는 아침부터 그것을 실감하고 있는 중이다.
지금 내가 있는 이 곳. 머리만 살짝 움직이면 맞닿을 거리에, 어떤 여인의 목덜미 뒤에서 풍겨오는 살 냄새에 흠뻑 취해 나는 연신 콧구멍을 벌름거리고 서 있었다. 인공으로 만들어진 강렬한 향수 냄새와는 달리 달콤하면서도 향기롭게 풍겨오는 냄새에 나는 절반쯤 넋이 나가다못해 정신이 아득할 지경이다.
아침부터, 그것도 심기를 일전해야 할 월요일 아침부터 나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는 냄새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처제다.
그녀의 몸에서 은은하게 풍겨오는 체취를 더 흠뻑 빨아들이고 싶어서 나는 몸을 조심스럽게 앞으로 움직였다. 그러고는 바로 내 앞에 서 있는 처제의 몸 뒤에 닿을락 말락 최대한 가까이 몸을 붙였다.
처제와 내가 서 있는 거리가 좁혀지자 나긋나긋하게 풍겨오던 그녀의 몸에서 풍기는 향기의 농도가 한층 더 짙어져 내 콧구멍 속으로 더 진하게 파고드는 것 같다.
‘어우! 돌아버리겠네.’
나는 몹시 당황했다. 그도 그럴 것이 출근길에 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작은 마을버스 안에서 아침부터 무섭게 욕정이 치솟아 오른 까닭이었다. 욕정이 자꾸만 내 몸의 한 군데에 집요하게 불을 붙이기 시작했다. 바지 속에서 아랫도리가 빠른 속도로 부풀어 올랐다.
난감하기 이를 데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려 혹시라도 누군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내 몸의 급격한 반응을 눈치 챌까 싶어 전전긍긍한 나머지 나는 주변을 슬며시 두리번거리다가 고개를 좌우로 세차게 흔들었다.
처제에 대한 생각을 떨쳐버리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았다. 나의 시선이 다시 처제의 목덜미 뒤에 꽂히고 말았다. 어찌된 일일까. 입 속에 고여 있던 침들이 빠른 속도로 메말라가는 기분이었다. 심지어 가슴까지 방망이질을 하듯 두근두근 거렸다.
나는 그 이유를 스스로 잘 알고 있었다. 섹스를 굶은 지가 벌써 열흘째였다. 하루만 그 짓을 안 해도 온 몸이 찌뿌듯한 느낌에 사로잡혀 매사에 의욕이 떨어지는 나였다. 그런 내가 열흘 넘게 바닥으로부터 층층이 쌓여있는 정액을 뽑아내지 못했으니 처제 뒤에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지도 몰랐다.
하고 싶어 미치겠다! 딱 그 문장만이 내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런 나를 가리켜 마누라는 천하에 둘도 없는 색골이라느니 또는 섹스에 중독된 환자 취급을 하며 치를 떨어대지만 솔직히 여자의 치맛자락만 봐도 욕정이 동하는 건 문지방 넘을 힘만 있으면 하루에도 몇 번 씩 틈나는 대로 여자와 그 짓거리를 하고 싶은 다른 남자들의 심정과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한다. 말하자면 수컷의 본능이란 말이다.
나는 뚫어져라 처제의 목덜미에 시선을 고정시켰다. 가늘고 기다란 눈부시게 하얀 목덜미를 보고 있노라면 사람의 피부가 어쩌면 이렇게 맑고 투명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면서 저절로 감탄사가 터져 나온다.
나는 바로 코앞에 있는 처제의 하얀 목덜미를 혀끝으로 부드럽게 핥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꼈다. 처제의 목덜미를 한참 동안 그렇게 주시하다가 시선을 점점 더 아래로 내렸다.
‘후아~~ 아무리 봐도 죽이게 빠졌네. 정말 돌아버리겠네.’
청바지를 입은 뒤태 곡선이 이렇게도 아름다울 수 있을까. 하체에 짝 달라붙은 청바지 속으로 처제의 빼어난 각선미를 머릿속에 그려보았다. 정말이지 다리 모델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쫙 빠진 매력적인 뒷모습 때문에 숨을 고르게 쉬기가 거북할 지경이었다.
바지를 뚫어버릴 듯이 딱딱하게 발기된 아랫도리의 힘찬 기운을 가까스로 억누르며 유난히 도드라진 처제의 탱탱한 엉덩이를 뒤에서 남몰래 훔쳐보고 있자니 이건 숫제 고문이나 다름없었다.
“저, 저기요…… 아, 아저씨. 조금 더 안으로…….”
처제의 뒤태를 끈적끈적한 시선으로 훑고 있던 그때, 낯선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중년의 어떤 밥맛없게 생긴 아줌마가 껌을 짝짝 ㅆ어대면서 조금도 미안해하지 않은 얼굴로 내게 양해를 구하고 있었다.
“아, 네에…….”
빌어먹을. 가뜩이나 좁은 버스가 정류장에 설 때마다 올라서는 사람들로 미어터질 대로 미어터지고 있었다. 하는 수 없이 내가 안쪽으로 몸을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처제 뒤에 서 있던 나는 벌레 ㅆ은 얼굴로 마지못해 걸음을 옮겼다.
처제의 몸 뒤로 거의 밀착시키듯 바싹 붙어 있던 몸이 애처롭게 떨어져 나가자 과장되게 말해서 왠지 세상과 마지막 이별을 고하는 그런 기분이었다. 더군다나 몸이 밀려 내가 두 다리로 짚고 서 있는 바닥은 처제와 나란히 서 있던 마누라의 몸, 바로 뒤였다. 내가 못마땅한 표정으로 속으로 땅이 꺼져라 한숨을 길게 내쉬던 그때였다.
“끼~익!”
귀를 찢을 듯 파열음이 요란하게 들리는가 싶더니 콩나물시루 안의 빽빽하게 서 있는 사람들의 몸이 동시에 앞으로 쏠렸다.
“어멋!”
“엄마야!”
“윽!”
“아따! 기사 양반. 거 살살 좀 갑시다.”
가파른 언덕길을 내려가며 마을버스가 또 다른 정류장에 다다라 급브레이크를 밟자 좁은 버스 안을 꽉꽉 채운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볼멘소리를 내기 시작한다.
늘상 있는 일이다. 나는 흐트러진 몸을 바로 잡았다. 그런데 바로 내 앞에 서 있던 와이프가 갑자기 고개를 홱 돌려 도끼눈을 치켜뜨고 나를 째려보았다.
나는 어리둥절했다. 나를 쏘아보는 마누라의 눈빛은 정말 한심스럽다는 빛이 역력했다. 대체 내가 마누라에게 무슨 잘못을 했는가 싶어 한참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마누라를 쳐다보았더니 마누라의 날카로운 시선이 내 가슴 아래로 재빠르게 내려갔다.
나도 마누라의 시선을 따라 ㅤㅉㅗㅈ았다. 이런 젠장! 그제야 나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달았다. 방금 전, 처제의 뒷모습을 훔쳐보면서 단단하게 발기된 내 물건이 마누라의 엉덩이를 압박하고 있었던 거였다.
많은 사람들로 인해 비좁은 버스에서 밀리고 밀려 서로가 서로의 몸에 어쩔 수 없이 바짝 붙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런 와중에도 마누라의 ㅈㄹ 맞은 성격을 잘 알고 있는 나는 거리를 두며 나름대로 조심한다고 했는데도 잔뜩 성난 물건이 얼떨결에 엉덩이를 찌른 모양이었다.
나는 마누라에게 미안한 표정을 지어보였다. 마누라는 요즘 기분이 몹시 좋지 않은 상태였다. 그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었지만 어젯밤, 나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술기운에 싫다는 마누라를 억지로 올라탔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견딜 수가 없었다.
하지만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했다. 막무가내로 성질을 부리며 강력하게 나를 거부하는 마누라 때문에 뻘쭘한 얼굴로 도로 내려와야 했다. 그저께, 그러니까 토요일 저녁에 집으로 놀러온 처제와 이틀 연속으로 술을 마셨는데, 어젯밤에도 지금처럼 욕정이 동해서 먼저 잠자리에 든 마누라의 배위로 슬그머니 올라탔던 것이었다.
술도 술이었지만 옆방에서 자고 있을 처제 생각에 불쑥 치밀어 오른 흥분을 못 이겨 그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던 것이었다. 고된 업무 탓에 늘 파김치가 되어있는 마누라가 그런 내 욕정을 잠자코 받아줄 리가 만무했다. 그 화가 오늘 아침까지 이어져 있는 거였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