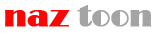가정교사
1화
웹소설 작가 -
본문

누구든지 출근 직전에는 머리가 뽀개져 버릴 듯이 아프다가, 막상 휴가를 신청하고 침대에 드는 순간 감쪽같이 통증이 사라져 버리는 경험이 있었을 것이다. 더구나 두뇌를 많이 사용하는 직장인일수록 그러한 경험을 많이 할 것이다.
증권회사에 다니는 민섭이 그랬다. 출근하려고 옷을 갈아입기 위해 거울 앞에 섰을 때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두통이 밀려왔다. 처음에는 출근해서 약을 먹으면 괜찮아지겠지 하는 생각에 억지로 옷을 입고, 아내 경화의 배웅을 받으며 아파트 문을 나섰다.
"도저히 출근 못 하겠는걸."
그러나 복도에 싸늘하게 고여있는 찬바람을 맞는 순간 두통은 수만 마리 벌떼들이 쏘아대는 것처럼 참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걱정스러운 얼굴로 지켜보고 있던 경화가 문을 닫기도 전에 되돌아서고 말았다.
"요즘 바쁜 것도 없고 하니까 하루쯤 쉬어도 괜찮을 거예요."
민섭의 나이 서른한 살, 말 그대로 힘이 넘쳐 날 나이다. 그러던 것이 작년부터 부쩍 침대에서 힘을 못 쓰는 것을 느끼고 있던 경화는 잘됐다는 얼굴로 민섭이 들고 있던 서류가방을 빼앗으면서 걱정스럽게 속삭였다.
"아무래도 그래야겠어."
민섭은 휴가라는 말에 이번 달 실적을 계산해 보았다. 이미 목표치는 초과한 상태라서 하루쯤 쉰다고 해서 월말에 상사에게 잔소리를 듣는 일은 없을 것 같았다. 그보다는 잘못하다 된통 감기라도 걸리는 날이면 더 큰 문제라는 생각에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면서 기운 없이 말했다.
"병원에 안 가 봐도 되겠어요?"
"병원은 무슨 얼어 죽을 병원이야. 요즘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걸 거야. 하루쯤 푹 쉬면 괜찮아지겠지."
"자기 요즘 몸이 너무 안 좋아 보여요. 이참에 오늘 제기동 한약 시장에 가서 보약이라도 한 첩 지어 와야겠어요."
경화의 나이는 스물여섯이다. 스물한 살에 민섭을 만나서 결혼하고 나서 5년 동안 살다 보니까 척 하면 삼천리라고 민섭의 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은 있었다. 무엇보다 침대 생활을 보면 알 수 있다. 작년 봄만 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섹스했으나 가을로 접어들면서도 보름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다. 그 모든 것이 기가 약해져서 그럴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터라 단정을 짓듯이 말했다.
"보약은 무슨…."
민섭은 보약이라는 말에 구미가 당기기는 했지만, 자존심이 상해서 좋다는 표정은 짓지 못했다.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팀장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 전화기를 끌어당겼다.
"아빠, 오늘 출근 안 하는 거야?"
네 살짜리 지훈이가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민섭에게 쪼르르 달려들며 물었다.
"아빠, 아프시니까 귀찮게 하면 안 돼."
경화는 민섭에게 안기는 지훈을 끌어안으며 민섭이 전화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평소에 직장에서 신임을 받고 있어서 그런지 통화는 짤막하게 끝이 났다.
"저는 지훈이 하고 목동 엄마 집에 들렀다가 보약 지어 올 테니까 푹 쉬세요."
모처럼 집에서 쉬는 남편이 부담 없이 푹 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에 경화가 지훈을 내려놓고 안방으로 들어가며 말했다.
"친정에 빈손으로 가지 말고 장인어른 좋아하는 술이라도 한 병 사 가지고 가라고."
민섭은 만사가 귀찮았다. 옷을 벗고 잠옷으로 갈아입자마자 침대에 누웠다. 이불을 푹 뒤집어쓰니까 거짓말처럼 잠이 밀려왔다.
민섭이 일어난 것은 경화로부터 전화가 걸려 왔을 때였다. 경화는 몸은 어떠냐고 물은 뒤에, 보약은 제기동까지 가지 않고 목동에 있는 유명 한의원에서 지었다. 이왕 친정에 간 김에 동생도 보고 갈 겸 저녁을 먹고 갈 테니까 자기 좋아하는 해물탕을 시켜 먹으라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몇 시나 됐지?
전화를 끊고 난 민섭은 한결 몸이 가벼워진 것 같았다. 잠옷을 벗고 집에서 입는 추리닝을 입고 시계를 봤다. 그렇게 오래 잔 것 같지 않은데 시곗바늘은 오후 2시를 가리키고 있다.
젠장, 이럴 줄 알았으면 출근할 걸 그랬나.
- 이전글내 남편 장가보내기 20.01.30
- 다음글오욕의 꽃 20.01.3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