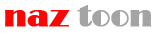모녀
1화
웹소설 작가 -
본문

모녀동련(母女同戀)
허 반장……
아랫마을 사람들은 그를 그렇게 불렀다. 국민학교 시절, 분단장도 못해본 그가 반장 한 번 시켜달라고 친구들에게 무던히도 졸라댔다 해서 붙은 별명이었다.
별명만큼이나 그는 싱거운 사람이었다. 사람 좋은 얼굴에 허우대는 멀쩡하였으나 이득 되는 일보다는 남의 궂은일에 휘둘리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도 마음만은 좋아 언제나 허허 웃고 다니기 일쑤였다.
가뭄이 극심하던 해에 어깨에도 차지 않는 땅딸보, 삼식이에게 멱살잡이를 당하자, 허허 웃으며 물꼬를 양보하고 말았던 그였다. 물러 터진 남편 때문에 속이 터지는 것은 허 반장의 마누라 순덕뿐이었다.
허 반장만큼이나 사람 좋은 얼굴에 펑퍼짐한 체형을 가진 그녀는 여자로서 작지 않은 키였으나 허풍선이처럼 약해 빠졌다.
하루 들일을 하고 나면 이튿날 하루 종일 에고 데고 방구들 신세를 져야 했으니 그들 부부의 살림이 넉넉지 못한 것은 이런 이유가 있어서였다. 그래도 자식 농사만은 남들 부럽지 않게 잘 지어 슬하에 2남 3녀를 두었다.
“우린 언제 남들처럼 살아 볼까?”
순덕이 입버릇처럼 한탄을 늘어놓으면 허 반장은 배포 좋게 소리치는 것이었다.
“까짓, 조금만 기다리라구. 내가 인터넷을 배워설라므네 도시 사람들하고 직거래를 트겠어. 당신 금반지도 해주고, 옷도 한 벌 지어줄 테니 국으로 기다려 보라구.”
그 즈음 허 반장네 살림이 그래도 반들반들 윤이 나는 것은 여고졸업과 함께 도회지로 나가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큰딸 덕분이었다. 월급 받는 족족 제 생활비만 달랑 남기고 송금을 해주고 있으니 기특하기 그지없는 딸이었다.
딸이 보내준 돈을 모으고 모아 허 반장은 이번에 큰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호랑이 똥값처럼 비싼 컴퓨터를 덜컥 사들인 것이다. 딴에는 인터넷을 배운답시고 밤낮으로 컴퓨터를 들여다보고 있었으나 순덕이 보기에 곰이 재주부리는 것 마냥 가소롭고 한심했다.
그러던 어느 날, 허 반장이 인터넷 덕을 톡톡히 보게 생겼으니 순덕으로서도 할 말을 잃고 말았다.
“거참 신통방통하네 그랴. 이 촌구석에서 장난삼아 올린 건데, 서울 사람이 그걸 보고 전활 했으니 말야. 허허, 참……”
허 반장네가 살고 있는 윗동네는 본래 다섯 가구가 옹기종기 한 형제처럼 지내왔다. 그러던 것이 한 집, 두 집 보따리를 싸서 도회지로 나가는가 싶더니, 석 달 전 영자네가 서울로 훌쩍 떠난 뒤로 공동묘지처럼 황량해졌다.
신기한 것은 아랫마을이었다. 열 채나 되는 집들이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넘쳐나고 있으니 신기하면서도 배가 아플 노릇이었다. 아랫마을 사람들은 귀신 나오게 생겼다 하여 윗마을 출입을 웬만해서는 하지 않고 있었다.
인터넷을 뒤지던 중에 벼룩시장이라는 사이트를 발견한 허 반장이었다. 그는 막연하게나마 많은 사람들이 볼 것이라는 생각에 영자네 빈집을 사이트에 올렸다. 경치 좋은 시골에 빈집 있으니 아무나 와서 그냥 살라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아침나절, 허 반장네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다. 전화를 받은 허 반장은 귓전을 울리는 나긋나긋한 중년 부인의 목소리에 가슴이 간질간질해지는 느낌이었다.
“빈집이 있다는데 맞나요?”
“예. 있습니다만.”
“보증금 없이 그냥 살 수 있다고요?”
“예. 몸만 오시면 됩니다. 자잘한 가재도구들도 꽤 남아 있거든요.”
부인과 통화를 하는 동안, 허 반장은 이상한 경험을 했다. 텔레비전에 등장하는 부잣집 마나님들의 고운 얼굴이 자꾸 떠올랐던 것이다. 목소리만 듣고도 부인의 우아한 기품과 아름다움을 눈에 그려볼 수 있었으니 허 반장의 상상이 맞는지는 두고 볼 일이었다.
‘그런데 서울 사는 부인이 뭐가 답답해서 이런 시골구석까지 오겠다는 건지 알다가도 모르겠단 말야?’
허 반장이 이런 의문을 품게 된 것은 전화를 끊고도 한참이 지난 뒤였다. 게다가 부인은 뭐가 그리 급한지 당장 이사를 해도 되냐고 두 번, 세 번 거듭해서 물었었다.
허 반장은 인터넷이 얼마나 대단한 물건이냐고 순덕에게 호통을 친 후, 집을 나섰다. 야반 도주하는 사람처럼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챙겨들고 고속버스를 타겠다고 한 부인이었다.
명색이 광고를 낸 사람이니 허 반장이 마중을 나가는 것은 당연한 노릇이었다. 기왕지사 마중을 나가는 바에야 아랫마을 삼식이한테 트럭이라도 빌려 타고 폼 나게 달려가 보자고 마음먹었다. 아랫마을에 당도한 허 반장은 삼식이를 보자마자 대뜸 소리쳤다.
“부탁이 있어서 왔다.”
“뭔 부탁?”
“트럭 좀 한 번 쓰자.”
“트럭은 뭐 하게? 봄 되려면 아직 멀었는데 벌써 비료들이냐?”
“그게 아니라 우리 뒷집에 이사오는 사람이 있다. 가서 짐 보따리 몇 개 실어오려고 그런다.”
윗마을에 이사오는 사람이 있다는 말에 삼식이는 회가 동한 듯 바싹 달려들었다. 그 사이 차 열쇠를 빼앗다시피 받아들고 허 반장은 읍내를 향해 폼 나게 달려가기 시작했다.
허 반장이 읍내에 도착하고도 1시간 남짓 지나서야 부인이 도착했다. 고속버스에서 내린 사람들이 대합실을 통과하여 모두 사라진 다음에야 허 반장은 기다리던 사람을 알아보았다. 그런데 부인 혼자가 아니었다.
허 반장은 그 모녀를 발견하자마자 놀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살가죽에 회칠을 해놓은 듯 하얀 얼굴과, 고운 머릿결, 부자집 마나님들 뺨치게 차려입은 입성이 한눈에 바라보였던 것이다.
40년 넘게 살아오면서 허 반장은 부인 같은 미인을 본 적이 없었다. 그만큼 부인은 뭇 사내들의 혼을 빼놓을 정도로 예뻤던 것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부인의 딸인 듯한 처녀 아이가 정상이 아니었다. 처녀 아이가 앉아 있는 휠체어가 왜 그리도 애처로워 보이던지 허 반장은 눈물이 글썽해지고 말았다. 하지만 그 처녀 아이 또한 어머니를 닮아서인지 곱기가 양귀비 저리가라였다.
그러나 처녀 아이의 아름다움은 부인의 그것과 왠지 느낌이 달랐다. 뭐랄까, 지기 전의 꽃봉오리처럼 애잔한 슬픔 같은 것이 느껴지는 아름다움이었다. 마치 병자처럼. 아니, 그녀는 몹쓸 병에 걸린 것이 분명했다.
“저 혹시…… 서울서 이사오시는 분들이 맞는지……”
허 반장은 혹시라도 자신에게 냄새가 나지 않을까 걱정되어 멀찍이 떨어져서 말을 건넸다. 그 순간, 두 여자의 까만 눈동자가 허 반장의 거무죽죽한 얼굴로 쏠렸다.
“예, 맞아요. 허 선생님이신가요?”
“허 선생은 아니고요…… 허봉굽니다. 허허.”
- 이전글복종 20.01.30
- 다음글우린 모두 누군가의 첫사랑이었다. 20.01.2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